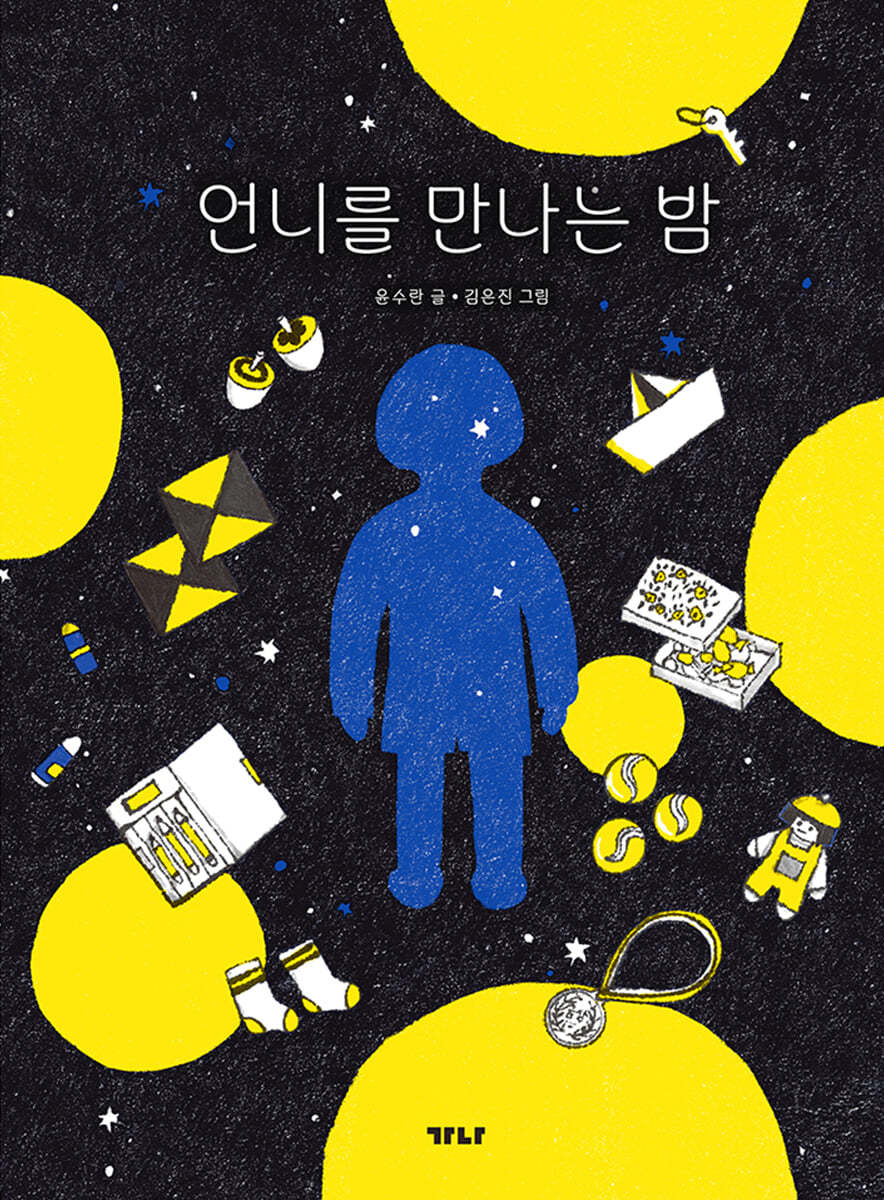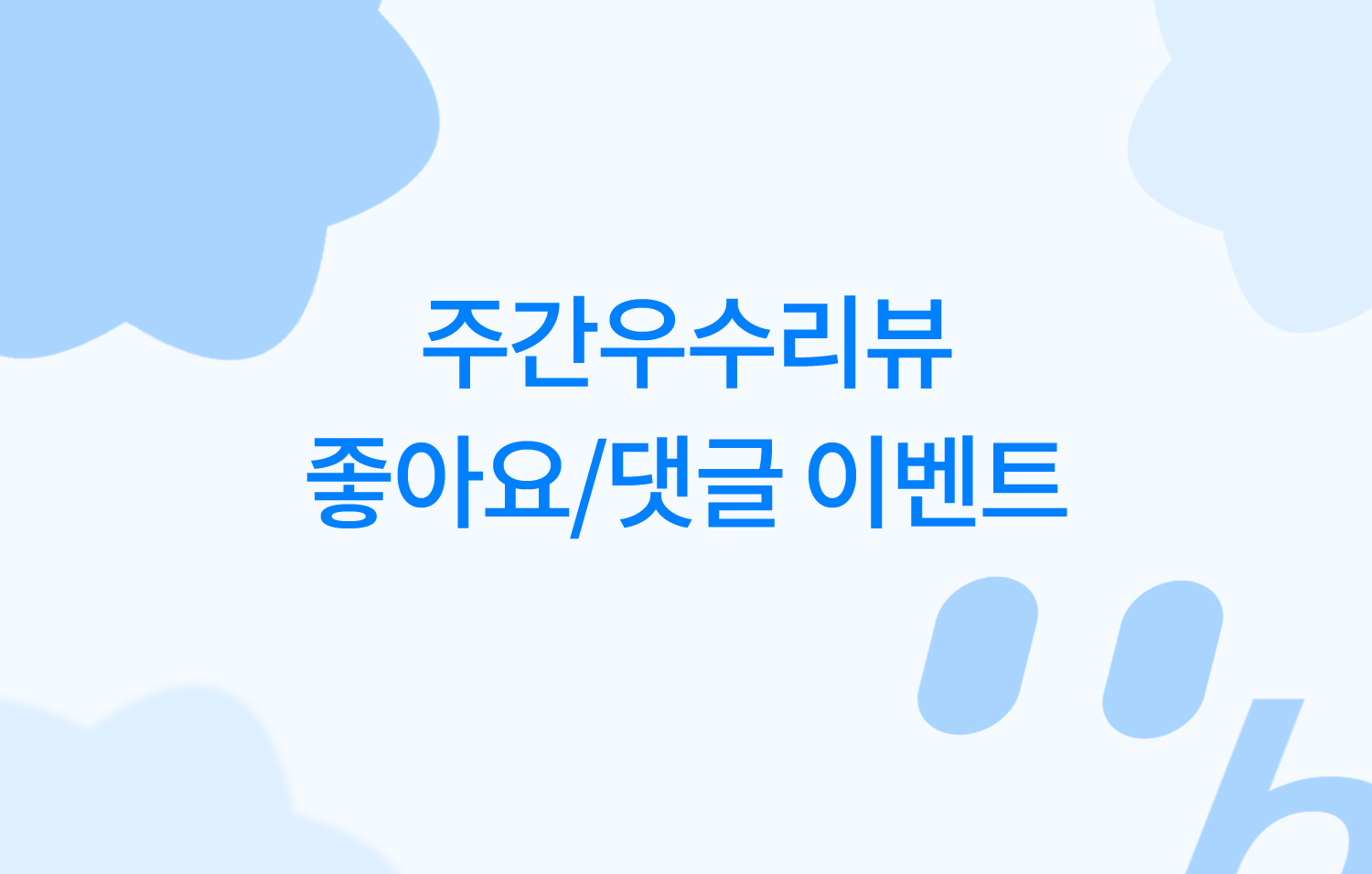연령 제한 상품은 성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.
인증 하시겠습니까?
- 인생의 지도같은 책들

꿈에 날개를 달자
- 작성일
- 2012.12.9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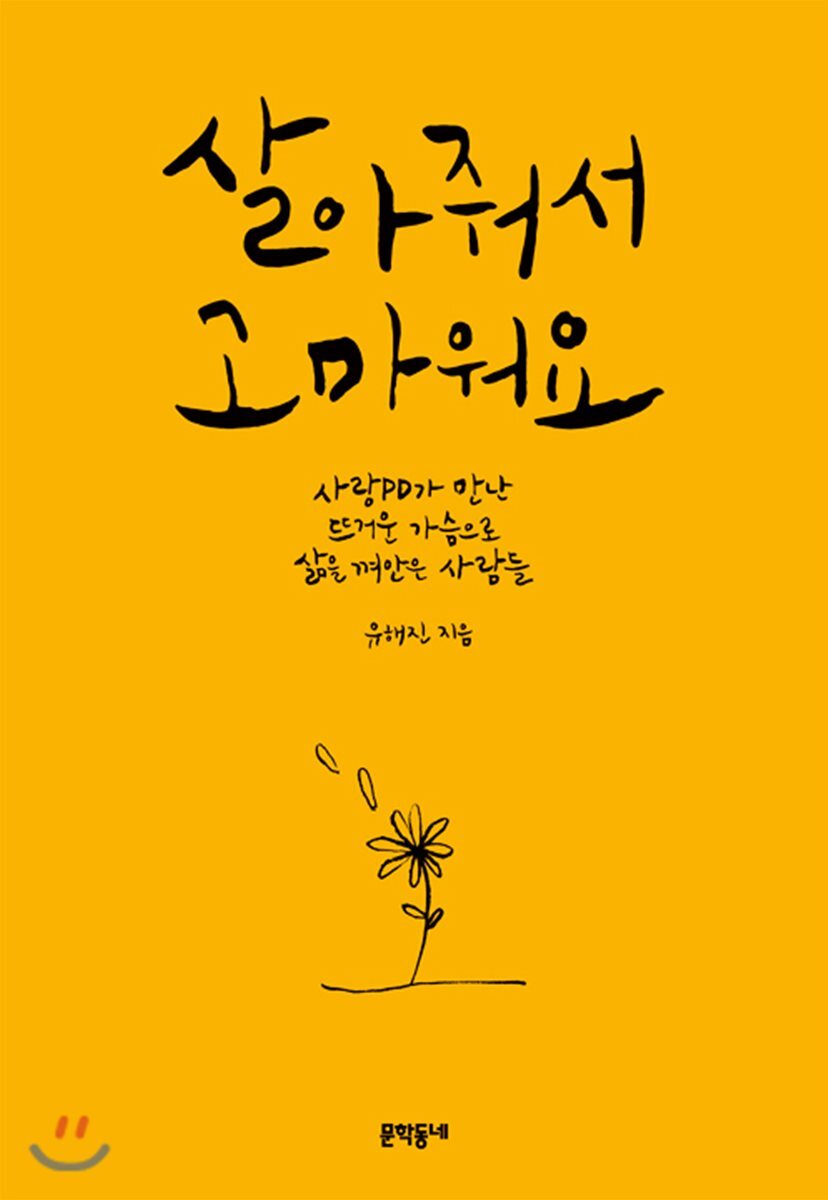
살아줘서 고마워요
- 글쓴이
- 유해진 저
- 출판사
- 문학동네
블루님 외 6명 이 좋아합니다
- 좋아요
- 6
- 댓글
- 18
- 작성일
- 2023.04.26
댓글 18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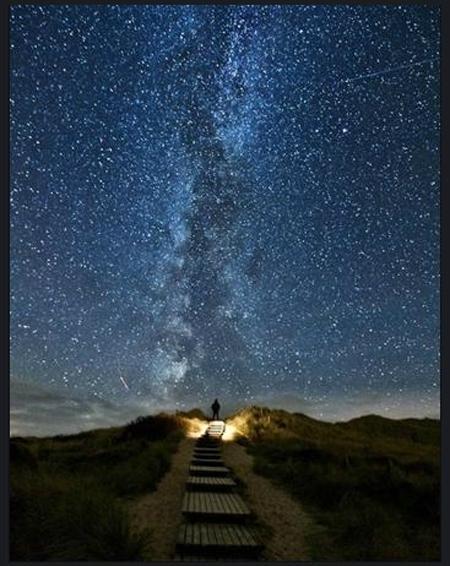
Dean
- 작성일
- 2012. 12. 13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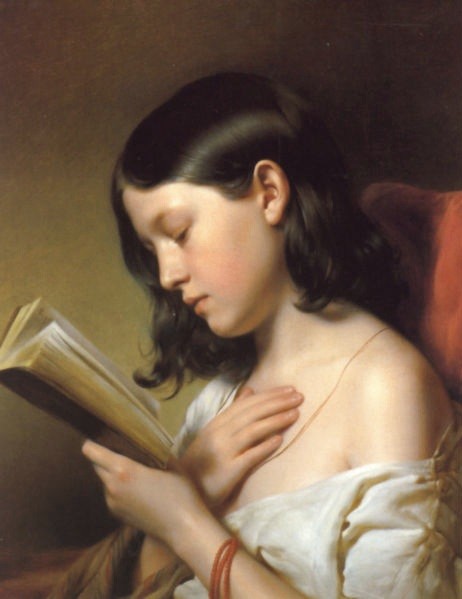
블루
- 작성일
- 2012. 12. 11.

깽Ol
- 작성일
- 2012. 12. 10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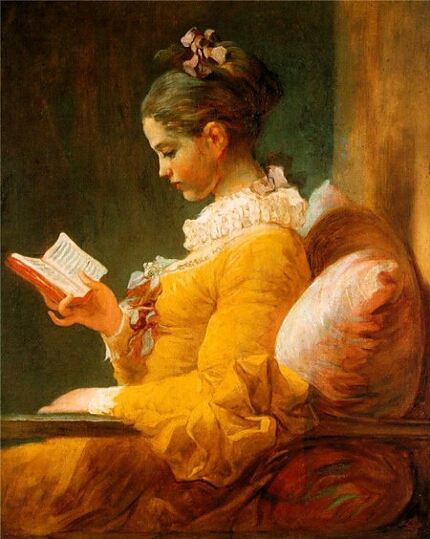
키드만
- 작성일
- 2012. 12. 10.

goodchung
- 작성일
- 2012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