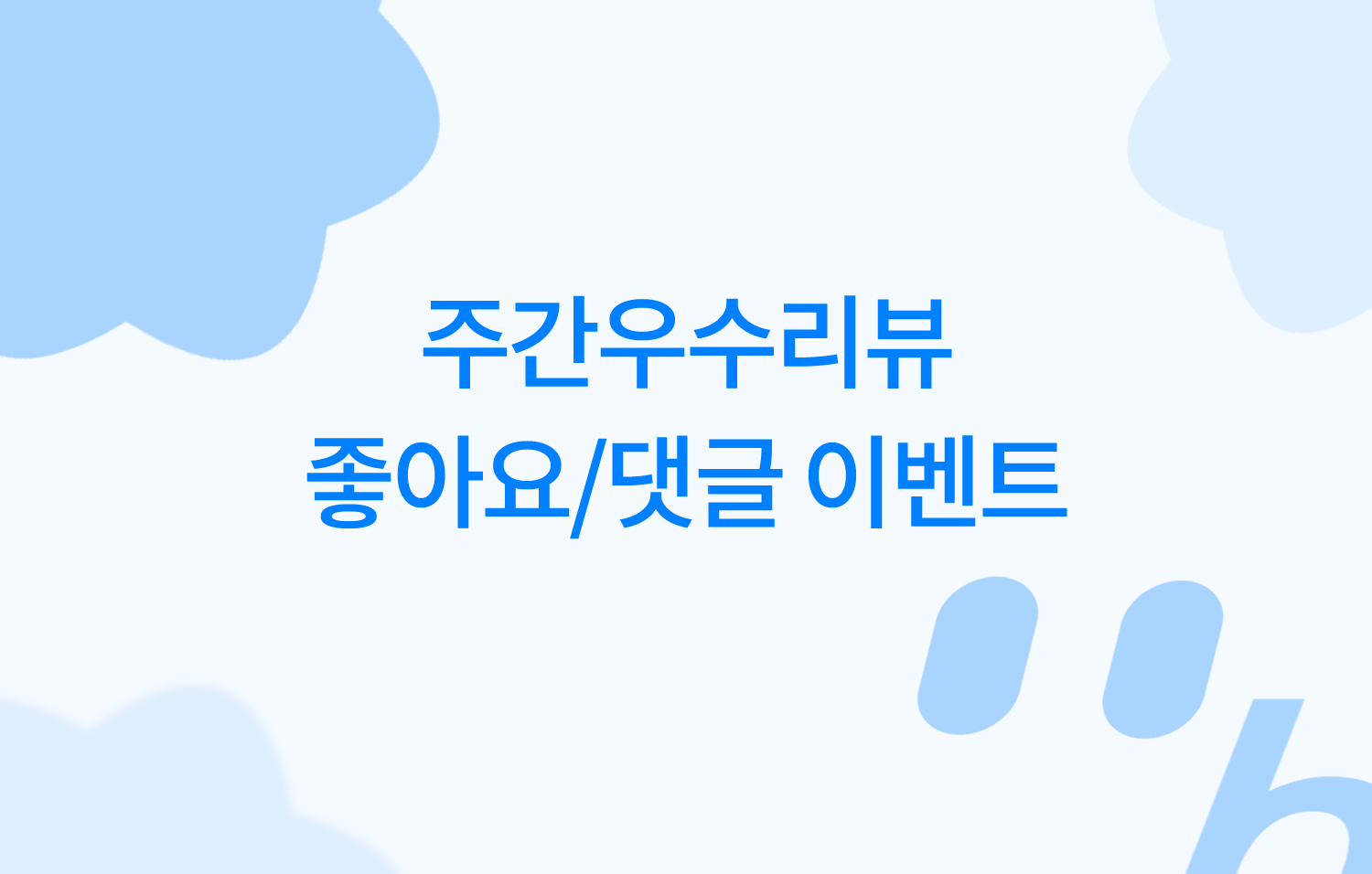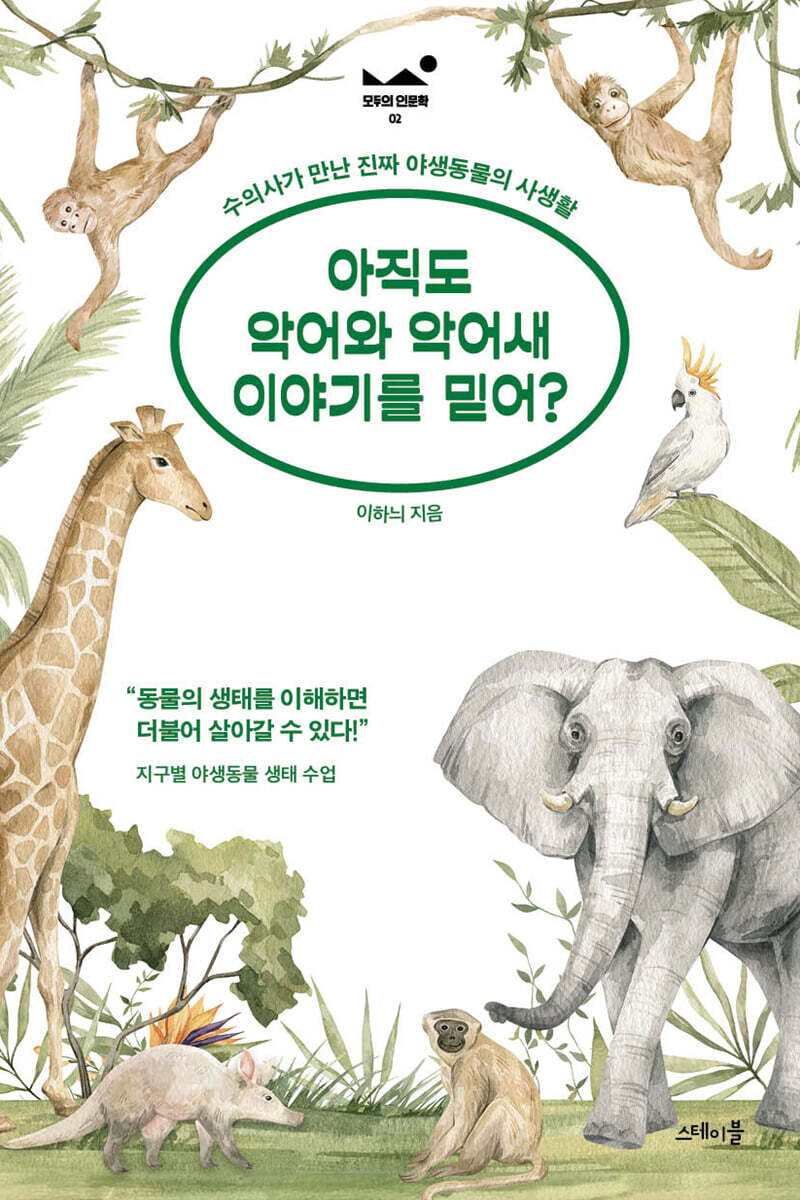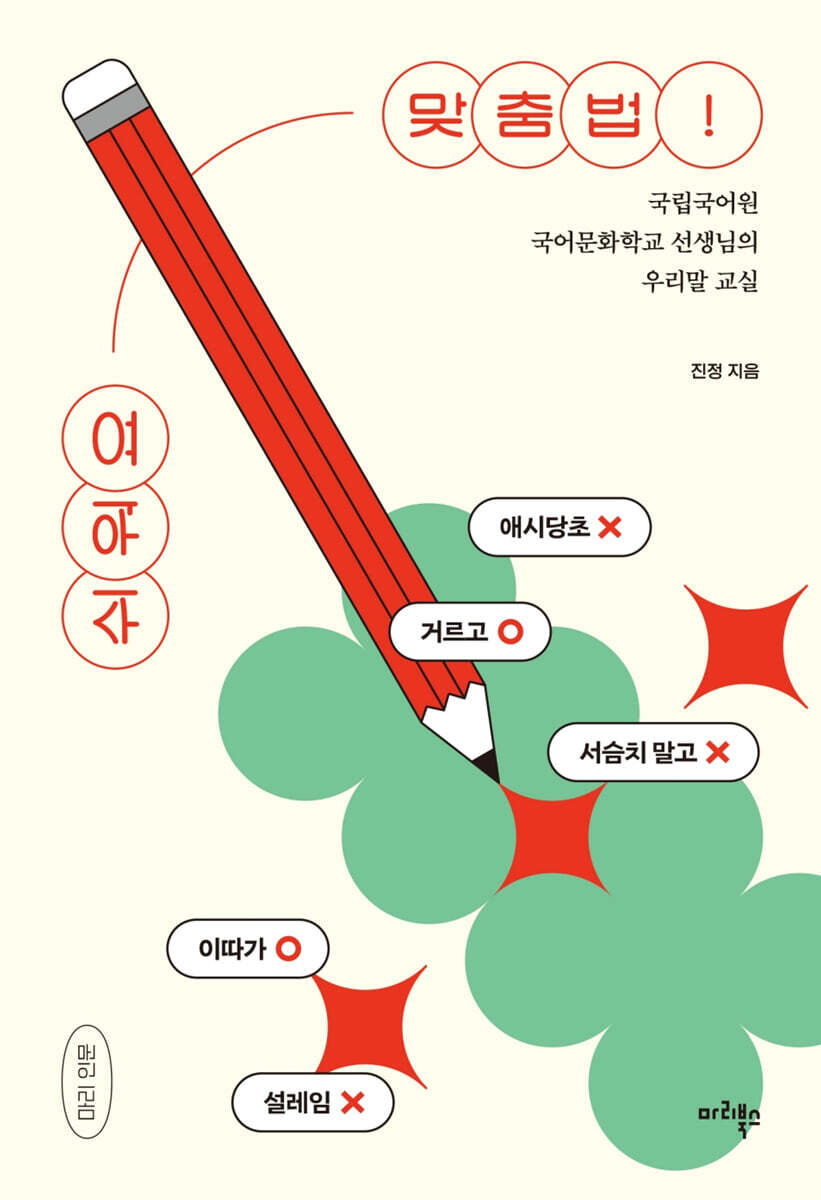연령 제한 상품은 성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.
인증 하시겠습니까?
- 아이와 함께 책을

꿈에 날개를 달자
- 작성일
- 2013.2.20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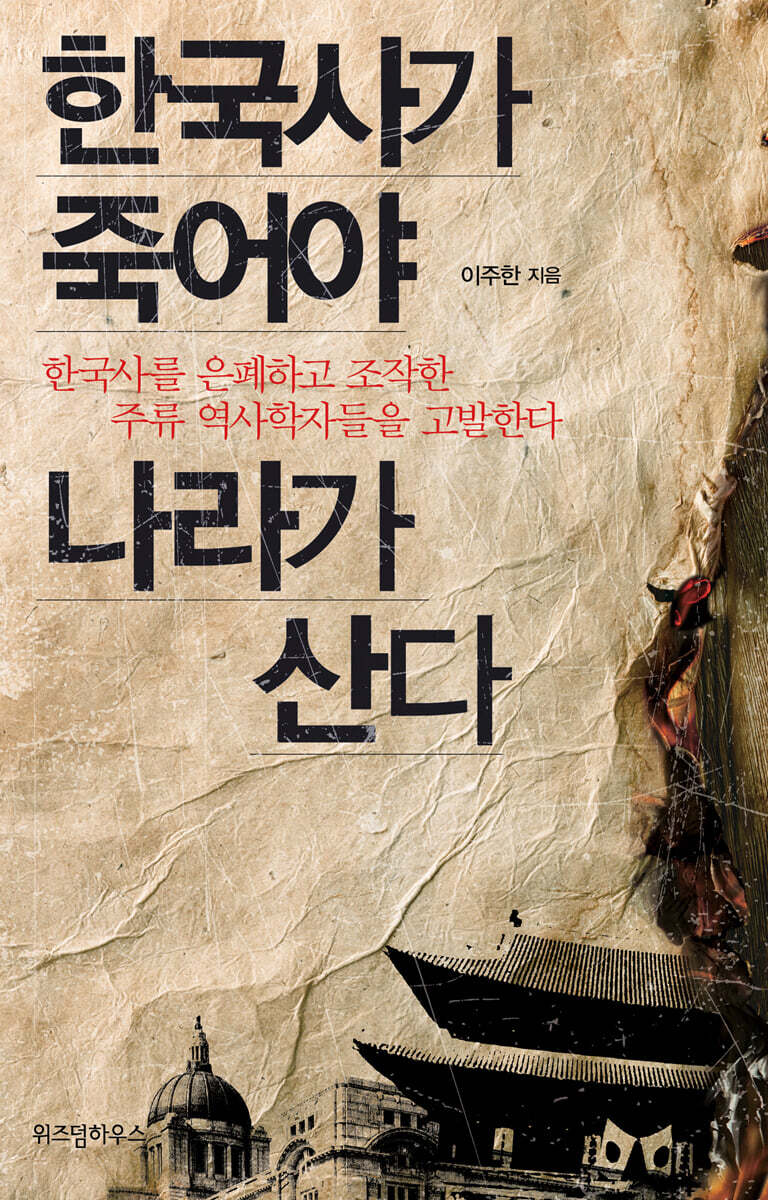
한국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
- 글쓴이
- 이주한 저
위즈덤하우스
유정맘님 외 14명 이 좋아합니다
- 좋아요
- 6
- 댓글
- 72
- 작성일
- 2023.04.26
댓글 72

kimsh480
- 작성일
- 2013. 3. 31.

큰엄마
- 작성일
- 2013. 3. 31.

chem38
- 작성일
- 2013. 3. 30.

무비스타
- 작성일
- 2013. 3. 30.

올드보이
- 작성일
- 2013. 3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