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령 제한 상품은 성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.
인증 하시겠습니까?
- 2015년 7,8,9,10,11,12월 책 읽는 주말

제니
- 작성일
- 2015.11.13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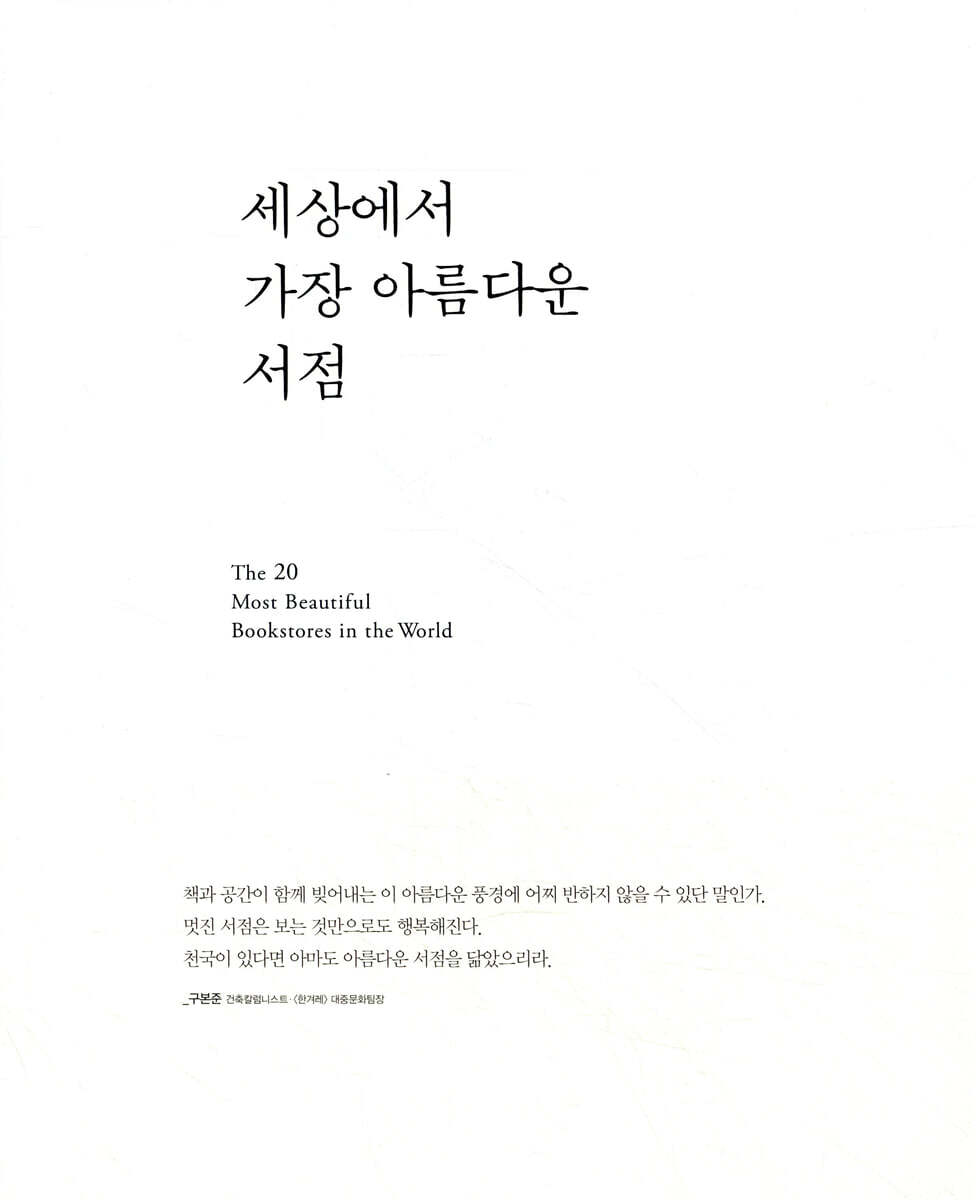
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
- 글쓴이
- 시미즈 레이나 저/박수지 역/Stefano Candito,Laetitia Benat 등 사진
- 출판사
- 학산문화사(단행본)
- 좋아요
- 6
- 댓글
- 0
- 작성일
- 2023.04.26
댓글 0

댓글이 없습니다.
첫 번째 댓글을 남겨 보세요.


제니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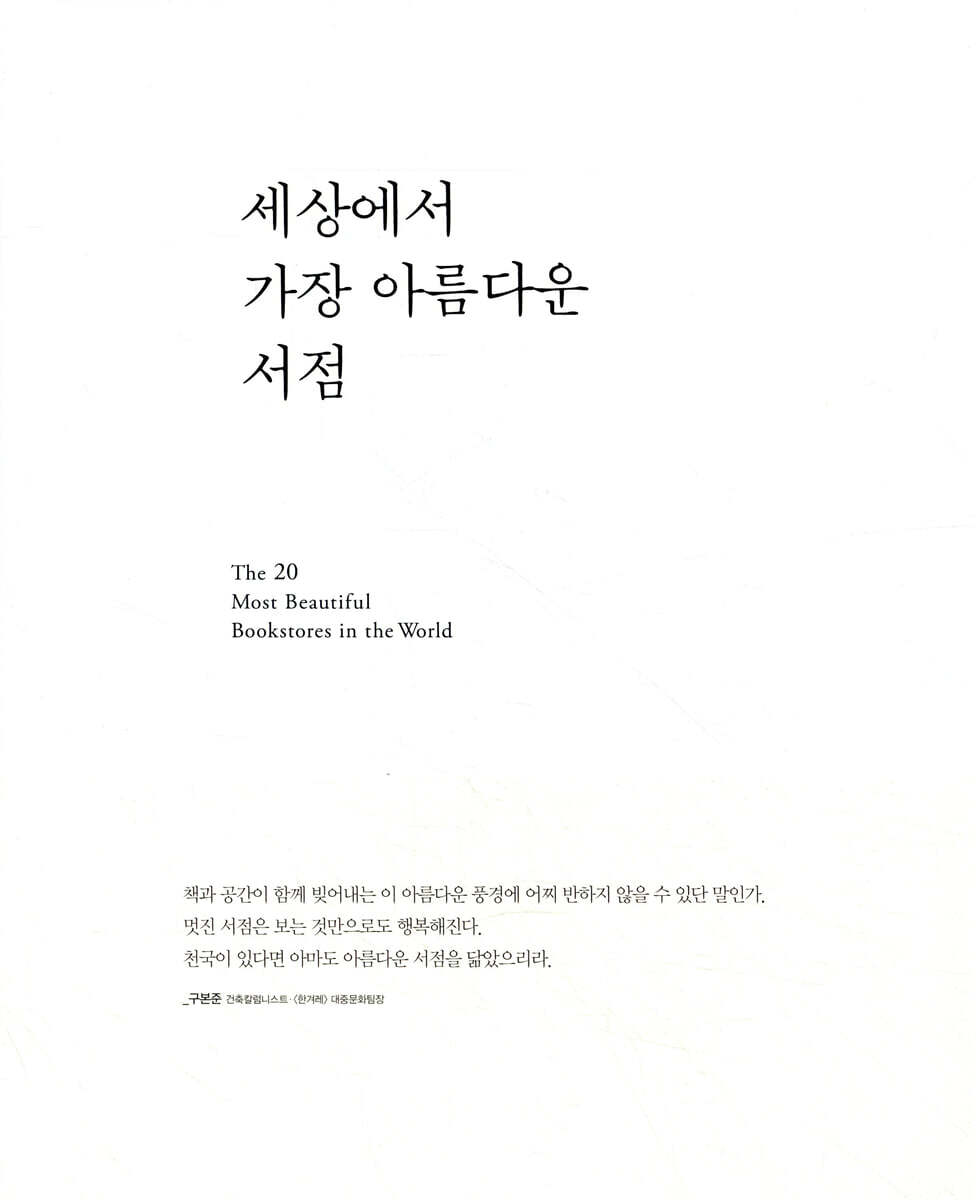

첫 번째 댓글을 남겨 보세요.